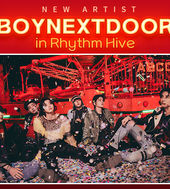흔히 우리가 기억하는 ‘보글보글’은 타이토의 ‘버블보블’을 대다수 전자 오락실 주인들이 ‘보글보글’로 표기하면서 기억에 남게 된 이름이다. 1970년대 말 등장한 오락실 문화는 1980년 대 들어 청소년게임이 대거 유입되면서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전자 오락실이 청소년유해업소로 인식되어 정부의 집중 단속을 받기도 했다.
‘벽돌격파’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포함해 남코의 ‘갤러그’가 등장하면서 숫자도 부쩍 늘어가게 된다. 오락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문구점이나, 동네의 작은 식품점에서도 심심찮게 오락실 게임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1983년에는 그 숫자가 8369개 이를 정도였는데 이 중 허가받은 곳은 불과 769개 업소였다. 이로 인해 위생과 치안에 문제점이 노출됐고, 사람들은 전자 오락실을 탈선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보산업의 해’로 지정됐던 1983년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에 따른 개인용 컴퓨터 게임이 등장하고, 닌텐도의 ‘패미콤’, 대우전자가 들여온 MSX 기반 게임기 ‘재믹스’ 등 가정용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달라지게 된다.
 |
오락실에서도 ‘스트리트 파이터2’와 ‘아랑전설 등 격투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버추어 파이터’와 ‘철권’,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시리즈 게임이 출시됐다. 인기를 끌었던 ‘철권’과 ‘킹 오브 파이터즈’에서는 태권도를 사용하는 한국인 캐릭터까지 등장했다.
한국의 게임 시장은 1990년대 초반 부터 PC가 가정까지 보급되면서 제대로 붐을 탔다. 386 컴퓨터가 등장한 1993년은 게임 시장 자체에 힘이 달라졌다. ‘프린세스 메이커’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를 비롯해, ‘원숭의 섬의 비밀’ ‘인디아나 존스’ ‘사조영웅전’ 등 일본 미국 대만의 PC 패키지 게임들이 큰 인기를 누렸다.
국내 게임도 1994년 한국회사인 손노리가 개발한 ‘어스토니아 스토리’가 첫 해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당시 1만장만 팔려도 ‘히트’라는 게임 시장의 개념을 달라지게 했다. ‘어스토니아 스토리’의 흥행에 질세라 ‘삼국지’ ‘칭기즈칸’ ‘수호지’ 등 코에이사들의 게임과 ‘프린세스 메이커’ ‘은하영웅전설 3 SP’ 등의 인기 해외 게임들도 한글화 되어 국내 시장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심지어 한글화 전문 개발사까지 등장하게 된다.
저장 매체가 플로피디스크에서 CD로 달라지면서 시장의 팽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어스토니아 스토리’ ‘창세기전’ 등 RPG가 주류 였으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전장르인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한 1998년부터는 게임업계의 지도가 확 달라져버렸다.
초고속통신망과 PC방 붐업과 함께 열풍이 분 스타크래프트 덕에 국내 개발사들도 RPG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까지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됐다. 8명의 유저가 사이버공간에서 어우러질 수 있었던 스타크래프트는 무려 국내에서 전세계 전체 판매량 1100만장의 40% 해당되는 450만 장이 팔렸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게임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게 됐다.
IMF 외환위기에 수많은 유통사들이 도산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는 갈수록 확대됐다. 불법 복제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프린세스메이커’ ‘창세기전’을 유통했던 만트라까지 쓰러질 정도였다. 개발사들도 초고속통신망 시대의 불법 복제 기승에 시달리다가 온라인 게임 개발로 사업 분야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6년 PC통신의 발달에 따라 등장했던 머드 게임을 게임사들은 눈여겨 봤다. 분당 10원에서 30원까지 받았던 머드 게임은 작지 않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크기를 해마다 키우고 있었고, 불법 복제를 피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다.
‘바람의 나라’를 만들었던 송재경은 엔씨소프트로 자리를 옮겨 ‘리니지’을 만들게 된다. ‘리니지’는 머드 게임에 그래픽 결합 형태였던 ‘바람의 나라’를 단숨에 뛰어넘는 큰 인기를 누렸다. ‘리니지’의 인기로 온라인 게임 시장은 무섭게 팽창하게 된다.
 |
‘바람의 나라’ ‘리니지’ 같은 정액제 게임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는 ‘퀴즈퀴즈’ ‘카트라이더’ 같은 부분유료 게임이 등장한다. 게임을 무료로 하면서 게임 아이템만을 유료로 구매하는 부분유료화 방식은 유저들이 예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세계적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부분유료화 방식’을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극찬할 정도였다. 국내 뿐만 해외 개발사들도 부분유료화를 적극 도입하게 됐다.
2004년 이후에는 장르가 더욱 다양해졌다. 기존 강세를 보였던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등 RTS, MMORPG 뿐만 아니라 캐주얼 게임, 스포츠 게임, 음악 게임, FPS 까지 다양한 장르가 온라인 게임 시장을 주도했다. 2008년에는 ‘아이온’의 성공으로 온라인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서비스 되면서 곧장 게임 시장의 인기척도가 달라졌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국 시장 서비스 이후 줄곧 3등 이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블레이드앤소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새로운 인기 게임의 등장에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 2017년에는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히트작이 되면서 국내 개발사들도 전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글로벌 히트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타크래프트로만 설명됐던 e스포츠 시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에 발맞춰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자리잡았다. 게임 방송국들도 기존 경기장의 크기를 키우거나, 새롭게 사업에 뛰어들었다. LOL e스포츠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종로에 10년간 롤 파크를 개관해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고용준 기자 scrapper@osen.co.kr
OSENBiz 주요뉴스
-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 ‘볼보 레이디스 데이’에 200명 이상 몰려 성황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 3년간 미래차 1,180억 원 투자…투자양해각서 체결
- 슈퍼레이스, CJ대한통운과 ‘9년 연속’ 타이틀 스폰서십
- 와이드앵글, KLPGA 방신실 프로와 스크린골프 챌린지 개최
- 아디다스, ‘2024 내셔널 풋볼 킷(National Football Kits)’ 공개
- [새책]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를 영어로 만나다
- '레드의 유혹' 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온스타 서비스까지
- EV 배터리 초고속 충전기술 기업 스토어닷(StoreDot), 'EVE 에너지'와 양산 파트너십 확대
- KG 모빌리티, 올해도 연속 신입/경력 사원 뽑았다
- 보상판매와 인증중고차, 현대차·제네시스의 EV 구매 유인책